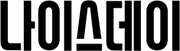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이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선진경제권으로 분류되는 37개국 중 20위 정도로 더 이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다가 이후 부채 수준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나랏빚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됐다.
새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의 효과가까지 더해지면 나랏빚 규모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추경(13조8000억원)과 2차 추경(30조8000억원)의 효과를 더하면 올 한해 나랏빚 증가 폭은12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67조2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1301조9000억원)하게 된다.
물론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건 사실이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GDP 성장률은 4개 분기 연속 0.1%을 넘지 못했고, 올해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9.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까지 상승해 재정준칙(3.0%) 상한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의 나랏빚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국가간 비교에 사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GDP의 50%를 넘어섰다.
D2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선진국 중 낮은 편에 속했지만 이제는 중간 수준까지 올라왔다. 2023년 기준으로 50.5%를 기록해 IMF가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 올해는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 D2 비율이 50% 중반대로 상승하고 순위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선진국 4곳 중 3곳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경기 대응에 나섰다가 이후에는 부채 비율을 줄였다. 37개국 중 28개국이 2020년에 비해 2023년 D2 비율이 하락했다.
기축통화국으로 불리는 미국(2020년 132.0%→2023년 119.0%)과 일본(258.4%→240.0%)도 팬데믹이 끝난 뒤에는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다. 2010년대 재정위기를 겪으며 '유럽의 문제아'로 불렸던 이탈리아(154.3%→134.6%), 그리스(209.9%→165.2%), 스페인(119.2%→105.0%), 포르투갈(134.15→97.7%)도 모두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
2020년에 비해 D2 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45.9%→50.5%)을 비롯한 9개국 뿐이다.
이 중 체코(36.9%→42.4%), 에스토니아(19.1→20.2%), 홍콩(1.0%→6.3%), 라트비아(44.0%→44.6%), 룩셈부르크(24.5%→25.0%), 뉴질랜드(43.2%→47.0%) 등 6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고 대부분 증가폭도 크지 않았다.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더 높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나라는 핀란드(75.4%→77.3%)와 싱가포르(148.2%→172.8%) 두 곳 뿐이었다.
이 때문에 느슨해진 재정 규율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가 좋지 않을때 지출을 늘렸다가 경기가 호전되면 긴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해 중장기적 건전성을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정책과 정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기축통화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창규 교수는 "재정 준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2025.07.11 (금) 19:31
2025.07.11 (금)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