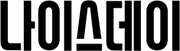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중순까지로, 아직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공정위원장 자리는 장관급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문제는 한 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주일만에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취임 55일 만에 송옥렬 서울대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당시 조성욱 전 공정위 위원장은 후임 인선이 발표되기 전 임기를 약 4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내부 인사와 정책 기능이 리더십 부재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 조사의 경우 정권 방향성과 큰 관계 없이 계속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각종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 일정은 계속해 소화 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정책과 인사 영역까지 맡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가장 큰 정책 현안은 플랫폼법 입법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플랫폼법 제정 시도를 거론하고 있어, 공정위는 새 정부의 공약을 존중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인력 충원 방식도 중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공정위 인력 추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인사무소부터 경제분석국이나 갑을 문제를 다루는 하도급·가맹·유통국, 혹은 최근 국민 경제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플랫폼 문제를 전담할 플랫폼국 신설 등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 50일 뒤 임기를 마치는 한 위원장이 키를 쥐고 굵직한 현안을 끌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내부 인사 역시 서둘러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 자리에 현직 상임위원이던 남동일 부위원장을 내부 승진 시켰다.
문제는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를 시작으로 이어져야 할 국·과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특히 상임위원 공석의 영향이 큰 상황이다.
상임위원은 전원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교적 규모나 주목도가 작은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상당량의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를 늘리기 위한 상임위원 증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소회의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 부위원장은 사건 분야를 맡아온 김정기·황원철 상임위원과 달리 주로 정책 분야를 맡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척 사유가 적은 편이어서 공백의 영향이 더욱 크다.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안팎으로 후임 인선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다.
당초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했으나 인선이 늦어지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 교수 외에는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나 비상임위원 경험이 있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2025.07.30 (수) 04:18
2025.07.30 (수)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