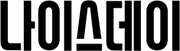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광물자원의 자급률이 3% 수준에 불과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의존도를 낮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30억 달러를 올렸고 수입은 139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68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2023년 180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선 1993년 이후 2022년까지 30년간 흑자를 유지했지만 2023년 수출액 급감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수출액 회복세에도 여전히 높은 수입액으로 적자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국은 전자, 화학 품목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화학 분야에서의 흑자폭이 예전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구조가 중간재 및 공급망 핵심 품목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환경이 변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67.0%로 확대됐고 공급망 핵심품목의 비중은 52.6%에서 5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배터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2018년 33.7%에서 2023년 65.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30% 수준, 통신장비, 컴퓨터 장비, 시청각 장비, 기타 전자부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37~47%를 유지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3년 기준으로 실리콘 75.4%, 게르마늄 74.3%, 텅스템 68.6%, 희토류 61.7% 반도체 핵심 원자재 중국 수입 의존도가 지속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뿐 만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등의 대응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큰 셈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광물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핵심광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과의 공급망 안전화 전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전 세계 광물의 30% 이상이 매장돼 있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등이 풍부해 대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최적의 대륙으로 꼽힌다.
리튬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짐바브웨와 나미비아 등에 다수 매장돼 있고 2022년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3%를 차지한 DR콩고, 니켈이 매장된 부룬디와 탄자니아, 모잠비크는 세계 최대의 천연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선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개도국 지원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서상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자본 투입, 기술, 인적 네트워크 등에서 핵심 광물 확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광물안보파트너십 다자협력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아프리카 핵심 광물 국가에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하고 양자 외교를 강화해 민간 협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5.02.08 (토) 23:49
2025.02.08 (토)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