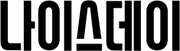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고물가를 주도했던 과일·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꺾일 줄 몰라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다.
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활물가가 올랐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6%에서 올해 1월에는 1.9%로 떨어져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3.5%에서 0.6%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계가 먹거리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은 품목별 등락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가계 구매 빈도가 높고 대체제가 별로 없는 품목들의 가격이 비교적 크게 오르는 현상도 관찰된다.
작황 부진과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배추(66.8%)는 2년 3개월, 당근(76.4%)은 7년 11개월, 김(35.4%)은 37년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귤(27.8%), 무(79.5%), 배(30.8%), 돼지고기(8.4%) 등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의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먹거리 물가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문제도 있다. 원재료인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공업제품에 포함되는 가공식품 물가는 1월 2.7%나 올랐다.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커피와 초콜릿이 8.1%와 11.2%나 뛰었다. 배추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김치는 17.5% 상승했다. 맛김(22.1%), 시리얼(14.7%), 오징어채(22.9%)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인서비스에 포함되는 외식 물가는 한 달 동안 2.9% 상승했다. 직장인과 학생들이 점심 메뉴로 자주 찾는 김치찌개백반(4.2%), 짜장면(4.2%), 짬뽕(4.4%), 김밥(4.7%), 떡볶이(5.4%), 햄버거(7.7%)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구내식당식사(3.8%)와 도시락(8.4%)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또 지난 몇 년 간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너무 컸다는 점도 가계의 체감 물가가 실제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9년(0.4%)과 2020년(0.5%)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부터 급등세로 전환했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비자물가는 약 14%가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먹거리 물가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채소는 25%, 축산물은 18%, 가공식품은 20%, 외식물가는 21% 가량 올랐다. 사과와 배 등 과실(과일)은 무려 51%나 뛰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먹거리 가격 수준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정도로 높게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가계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생산·소비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생산은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 원인으로 인건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 등의 요인을 꼽았다. 가공식품의 경우 이상기후, 재배 면적 감소, 환율 등의 영향으로 코코아, 코코아, 커피 등의 수입 가격이 올랐고,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와 사과, 단감 등 과일류가 대부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며 가격도 안정됐지만 무, 배추, 감귤, 배 등 일부 품목은 폭염 영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부는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비축·방출 등 먹거리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5.02.08 (토) 03:45
2025.02.08 (토)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