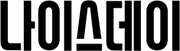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된 동시에,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 강화 영향이 다문화 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전년(2만431건)보다 1019건(5.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코로나 영향이 줄며 2022년 다시 반등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2만건대를 이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가 안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혼인 증가율(14.8%) 다문화 혼인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하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년(10.6%)보다 1.0%포인트(p) 감소한 9.6%를 기록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3416명으로 전년(1만2150명)보다 1266명(10.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1년 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며 1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증가 폭(1266명) 역시 지난 2011년 1702명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증가율로 보면 10.4%로,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증가율(3.6%)을 압도하면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5.6%를 기록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정착 안정화와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을 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71.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외국인 남편 18.2%, 귀화자 10.6%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19.6%), 30대 후반(17.0%) 순으로 높았다. 아내의 경우 20대 초반의 비중이 23.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3.0%), 30대 후반(15.5%)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 초혼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고,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7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7.4세로 1년 전과 비교해 0.3세 하락했다.
부부 연령차별 비중은 남편 연상이 76.2%로 가장 높고, 아내 연상이 17.9%, 동갑이 5.9%를 차지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7.3%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다.
출신 국적별 혼인을 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고, 중국(6.0%), 베트남(3.6%)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6.8%로 가장 많고, 중국(15.9%), 태국(10.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992건으로 전년(8158건)보다 166건(-2.0%) 감소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과 유사했다.
뉴시스
 2025.11.08 (토) 01:07
2025.11.08 (토)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