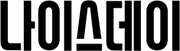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다시 돌아온 5월, 처연함이 묻어 나오는 묘지 곳곳에는 이날도 45년 전의 아픔을 위로하러 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얼굴 한 켠에 복잡한 표정을 띄운 채 느린 걸음으로 화강암 타일을 밟으며 40m 높이 추모탑을 향해 걸었다.
민주의문과 추모탑 사이 200여m 거리는 공식 참배곡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채워졌다. 추모객들은 지나온 45년 세월을 곱씹으며 걷겠다는 듯 한 박자 한 박자 정성들여 추모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은 푸르른 녹색이 가득한 묘지를 처음 보는 듯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나섰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마친 가족 단위 참배객들은 이내 저마다 흩어져 열사들의 묘소로 향했다. 추모객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온다' 속 주인동 동호의 모티브가 된 고등학생 시민군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 등을 찾았다.
문 열사의 묘소 앞에 세워진 그의 생애가 담긴 표지판 앞에서 추모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보이다 이내 묘비를 닦고 묵념했다. 1980년 5월27일 최후항전 당시 동급생 안종필 열사와 함께 계엄군에 저항하다 숨졌다는 이야기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몰아 쉬었다.
묘지는 이날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산 교육장 역할을 했다.
한 아버지는 초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광주지역 최초 5·18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씨의 묘소를 찾았다. 김씨가 계엄군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때렸대요?" 라고 묻는 아들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단어를 고르는 듯 무거운 침묵을 잇다 "그러게 말이다"라고 답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반인도적인 유혈 진압 사유은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둔 이날도 구천을 떠도는 넋들과 추모객들에게 물음표만 남겼다.
5·18 45주기를 맞아 임시개방된 광주 동구 옛 적십자병원에서도 분연한 항쟁을 기억하고자 모여든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했다.
5·18사적지 제11호로 지정된 옛 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의료진들이 부상자 치료에 헌신한 공간이자 헌혈 행렬로 뜨거운 시민정신을 나눈 역사적 공간이다.
서남학원이 1996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매입해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운영하다 2014년 휴업, 2020년 광주시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이렇다 할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던 공간은 이번 임시개방과 함께 전시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진행 중이다.
전시는 1층 복도와 응급실, 중앙현관, 뒷마당을 개방하고 5·18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에게 피를 나눴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낡은 응급실 내 5·18 당사자들의 인터뷰 상영관을 지나 1층 복도에 이어 현관 사진전까지 통하는 동선을 관람하며 시민들은 45년 전 숭고했던 희생정신을 기렸다.
시민들은 5·18 45주기를 맞아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를 떠올리며 오월 영령이 남긴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장유성(45)씨는 "태어난 해 5·18이 있었고 작년 12월 비슷한 상황을 겪을 뻔했다. 45년 전의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립한 민주주의와 헌법이 또다시 유린당하고 말았다"며 "되새기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묘지를 찾았다. 이제 모두가 계엄을 겪은 세대가 된 만큼 오월 영령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힘써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진주(36·여)씨도 "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에 걸쳐 민주주의가 유린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1980년 5월 광주는 시민들의 피까지 흘러넘쳤던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비극이었다"며 "스러진 열사들의 넋을 이어받고자 묘지를 찾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2025.07.14 (월) 05:55
2025.07.14 (월)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