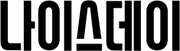|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의학기술의 발달,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고 그간 여섯 차례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민간전문가들은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세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및 빈곤율, 사회적 인식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노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70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기대수명을 꼽았다. 현행 노인 연령 65세를 정한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하면 현재 기대수명은 15.6세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다.
이들은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며 "또한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 연령은 2023년 기준 71.6세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정부 정책 대상의 노인 연령 기준으로 68.2%가 70세, 23.3%가 66~69세, 8.5%가 71세 이상을 꼽았다.
단 이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현실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라며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 연장 및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 역시 상향하되 소득이나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별로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제도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청년·중장년·노년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5.07.13 (일) 10:44
2025.07.13 (일) 10:44